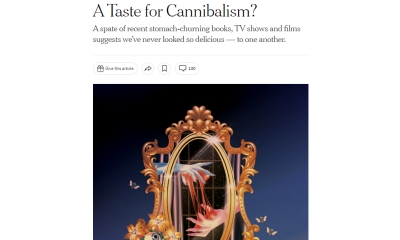뉴욕타임스가 식인 행위를 옹호하는 ‘식인의 맛’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알렉스 베그스가 쓴 지난 10일의 이 글은 대중문화에서 식인 풍습이 점점 더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때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의 스타일 섹션에 실린 글에서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쇼타임 시리즈인 ‘옐로재킷’의 공동 제작자들에게 ‘식인이 등장인물들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공동 제작자인 애슐리 라일은 옐로 재킷의 영감에 대해 “저는 종종 우리가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에 끌린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동 제작자인 바트 니커슨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 중 어느 부분이 혐오하는 것의 황홀경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라일은 팬데믹, 기후변화, 학교 총격, 정치의 양극화 등을 우리가 이상한 순간에 와 있는 증거로 보았다. “저는 우리가 분명히 매우 이상한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식인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의 범주에 매우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다가오고 있는 식량 위기에서 식인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가 있거나, 식인을 내세워 육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후자보다는 전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보인다. 2019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 경제학 교수인 마그누스 소더룬드는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인을 언급했다.
그는 스웨덴의 TV4에 출연해서 “저는 다소 망설여지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이진 않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것을 맛보는 데에 열려 있다고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을 유발한 뉴욕타임스 글의 저자인 베그스는 글 초반에 첼시 G. 서머스의 신작 소설 ‘어떤 배고픔’을 언급한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여성은 죽은 남자친구의 간을 먹으며 살아남는다.
서양의 대중문화에서 식인은 아주 생소한 주제는 아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재조명 받고 있는 영화 중에는 1973년작 ‘소일렌트 그린’이 있다. 이 영화는 공해, 빈곤, 인구과잉 속에서 정부가 안락사를 시행하고, 안락사 처리된 시체들이 음식으로 재활용되는 일을 한 경찰이 발견한다. 이 영화의 배경은 2022년이다.
Cannibalism has a time and a place. Some recent books, films and shows suggest that the time is now. Can you stomach it? https://t.co/JzU1QRPYxV
— The New York Times (@nytimes) July 23, 2022
Starting to prep people for the idea for what is about to come. Here another article on it. pic.twitter.com/AtJIhujq1I
— Thomas (@Thomas_Fertner) July 23, 2022
Soylent Green 2022 pic.twitter.com/5G3Be0Vsve
— Rachel Mary ♀️ (@RachelMaryColl) July 22, 2022